

![[박준석] TV스페셜](https://img.wownet.co.kr/banner/202508/2025082621c6d0c271f84886a953aee25d7ba0c0.jp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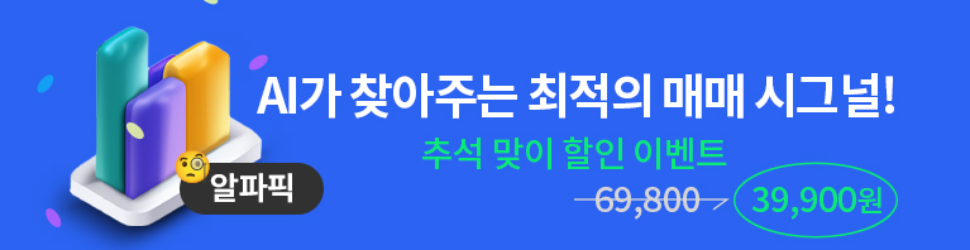

암호화폐나 밈주식은 이제 잊어라. 새로운 투자 광풍의 주인공은 'AI 인프라'다. 데이터센터들은 실리콘과 냉각코일로 가득 찬 미로같은 시설을 구축하며 여유자금과 구리, 토지를 모조리 집어삼키고 있다.
JP모건의 마이클 셈발레스트 시장투자전략 의장은 최근 시장보고서에서 이를 공포영화 '블롭'에 비유했다.
그는 AI 기업들의 자본지출 폭증이 주가, 투자자 기대감, 설비투자가 서로를 강화하는 자기강화 루프를 만들어냈으며, 이는 한번 시작되면 멈추기 어렵다고 분석했다.
차트상으로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등 소수 기업들이 시장 수익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그는 지적했다.
셈발레스트는 "AI 관련주 참여가 극도로 제한적"이라며, S&P500 지수의 시장 폭이 닷컴버블 때보다 더 빠르게 축소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원작 영화의 블롭이 유기물을 먹어치웠다면, 현재의 블롭은 전기를 집어삼키고 있다. 연구진들은 2030년까지 미국 데이터센터 규모가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며, 현재 4% 수준인 전력 소비량이 미국 전체 발전량의 12%까지 증가할 수 있다고 추정한다.
이는 이미 전력망 현대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에게 단순한 물류 문제를 넘어 지정학적 과제가 되고 있다. 여기에 보조금, 관세, 국방 관련 자금까지 더해지면서 반도체, 에너지, 컴퓨팅 능력을 둘러싼 글로벌 경쟁은 새로운 형태의 중상주의를 닮아가고 있다.
모든 국가가 AI 주권을 원하고 있으며, 미국은 자본과 에너지가 자국 내에 머물도록 하고 있다. 이는 또 다른 광기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바로 지출이다.
맥킨지에 따르면 향후 5년간 AI 관련 반도체, 데이터센터, 에너지 비용이 6.7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맥킨지는 이 랠리에 참여하는 5가지 주요 투자자 유형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맥킨지의 판카즈 사치데바 수석 파트너는 기업들의 AI 시범사업 성공률이 "15% 미만"이라고 지적했다.
여기에 지리적 위치와 에너지 문제도 있다. 기존 클러스터들의 여유 전력이 부족해 텍사스, 노스다코타, 뉴멕시코 등 저렴한 토지와 재생에너지 공급이 가능한 지역에 새로운 대규모 시설들이 들어서고 있다. 그러나 이런 원격지는 송전망 구축과 전력망 업그레이드 등 추가 비용과 함께 자산 고립이나 과잉 구축 같은 위험도 수반한다.
이처럼 막대한 비용은 신중하면서도 신속한 자본 투자의 균형을 요구하지만, 5개 주체의 이해관계를 완벽히 조율하는 것은 쉽지 않은 과제다.
사치데바는 공공설비 기업들의 장기계약 위험성을 논하며 "이들 기업 중 어느 곳이 5년, 10년 또는 15년 후에도 살아남을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상황이 복잡해지고 있다. 실리콘밸리는 금속과 전력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더욱 순환적인 방식을 찾아냈다: 자체 자금조달이다. 셈발레스트가 "순환적 자본 생태계"라고 부르는 이 구조에서 기업들은 자사의 기업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서로의 꿈에 투자하고 있다.
오픈AI는 오라클, AMD, 엔비디아와 대규모 용량 계약을 체결하고, 엔비디아는 클라우드 기업들의 지분을 매입하며, 클라우드 기업들은 엔비디아 장비 구매를 약속한다. 스타트업들은 자신들이 구매할 장비를 만드는 업체들로부터 투자를 받는다.
이는 새로운 현상은 아니다. 철도와 통신 붐도 비슷한 자기참조적 낙관론으로 진행됐지만, 오늘날의 속도는 전례가 없다. AI 생태계는 실현된 이익이 아닌 주가 상승으로 각각의 새로운 자본투자가 정당화되는 지출과 시가총액의 순환고리가 되었다. 물론 위험은 수익이 정체되는데 감가상각과 전기요금은 그대로일 때 발생한다.
결국 AI 붐은 유토피아로 가는 직선이 아닌 고압 전류가 흐르는 러닝머신에 가깝다. 칠레의 광부에서 실리콘밸리의 클라우드 거인들까지 모든 계층이 제자리에 머물기 위해 더 빠르게 달리고 있다.
자본은 순환하고 에너지는 실제로 소비되며, '블롭'이 전압만 집어삼키지 않고 그 창조자들까지 삼켜버릴 수 있다는 것이 위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