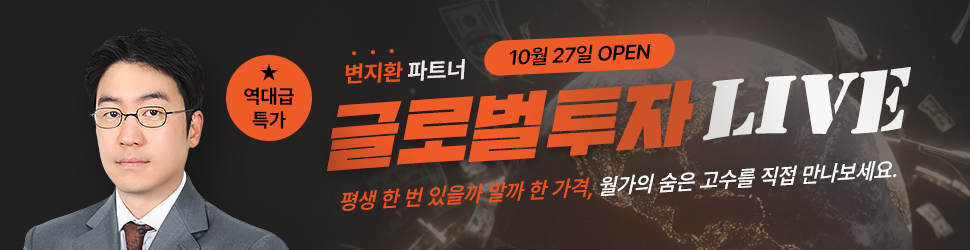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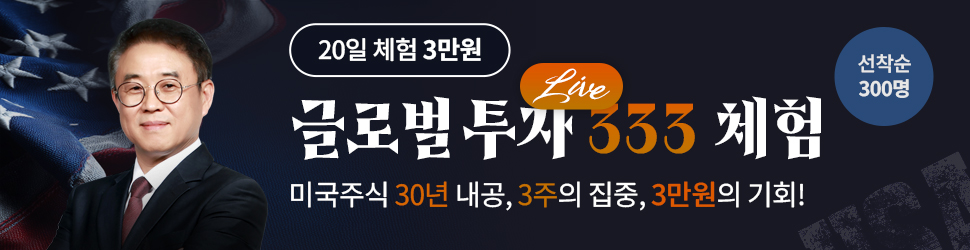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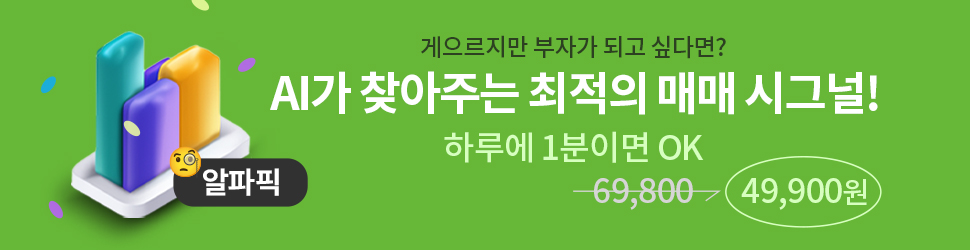

오크트리캐피탈의 공동 창업자이자 공동회장인 하워드 막스가 35년간 작성해온 유명 투자 메모가 주목받고 있다.
막스는 지난 10월 20일 마스터 인베스터 팟캐스트와의 심층 인터뷰에서 자신을 '하룻밤 사이 성공'으로 이끈 메모에 대해 회고했다. 그는 2000년 1월 당시 닷컴버블을 예견한 몇 안 되는 투자자 중 한 명이었다.
그는 에드워드 챈슬러의 '악마여 뒤쳐진 자를 데려가라'라는 금융 투기의 역사를 다룬 책에서 영감을 얻었다고 설명했다. 막스는 남해 거품 사태에서 나타난 주식 투기 광풍, 투기 열풍, 맹목적 믿음 등이 1999년 말 인터넷 주식 과열 현상과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고 말했다.
"'이런, 지금 기술주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구나'라고 생각했다"고 그는 설명했다. 다만 그는 "예측이 정확했고, 빨리 맞아떨어졌다는 것은 운이 좋았다"고 덧붙였다.
예측과 포지셔닝의 구분은 막스의 세계관을 관통한다. 그는 시기는 알 수 없고 단지 시장 사이클의 대략적인 위치만 파악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지 절대 알 수 없지만, 현재 어디에 있는지는 반드시 알아야 한다." 그는 고평가가 '내일 하락'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자신이 예상한 시점에 합리성이 돌아올 것이라고 베팅하는 것은 '치명적'일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막스는 '시장의 체온 측정'에 집중하며 투자자들의 행동, 가격, 리스크가 스토리를 말해주도록 한다.
그는 유명한 버블닷컴 메모에서 워런 버핏의 말을 인용했다.
"투자의 핵심은 산업이 사회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얼마나 성장할지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기업의 경쟁우위와 그 우위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것"이라고 버핏은 1999년 11월 포춘지에서 말했다.
이는 오늘날에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 AI가 세상을 바꿀 것이지만, 막스는 효율성 향상이 곧바로 수익성 보장으로 이어진다고 보는 것을 경계한다.
"한 산업의 모든 기업이 AI를 도입해 효율성을 높이고, 가격 경쟁을 하게 되면 특별한 수익성은 사라진다"고 그는 설명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을 바꾸는 것'과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반드시 같은 의미가 아닌 이유라고 그는 말한다.
투자 행동에 대해 막스는 분명한 입장을 보인다. 모멘텀을 쫓지 말라는 것이다. "좋은 가치가 있다고 판단될 때만 매수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한다.
수십 년간의 경험상 역발상 투자는 극단적인 상황에서 가장 효과적이라고 그는 지적한다. 매주 영웅이 되려고 하면 기껏해야 50대 50의 승률을 기록할 뿐이다.
막스는 '2단계 사고'에서 성공을 찾는다. 단순히 군중과 다르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사고를 하는 것이다. 이는 생각보다 드문 일이며, 그래서 그는 "50년 동안 진정으로 결정적인 시장 예측을 다섯 번 정도 했다"고 말한다.
막스는 수익을 내지 않는 자산은 멀리한다. 그는 자산을 현금흐름이 있는 것(주식, 채권, 건물)과 없는 것(금, 석유, 암호화폐, 예술품)으로 구분한다. 전자는 가치 평가가 가능하지만 후자는 '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에서 거래된다.
올해 금이 인기를 끄는 이유는 무엇일까? 벤저민 그레이엄의 표현을 빌리자면 주로 '투표 기계' 같은 심리적 요인이다. 순수한 공포심 때문이라면 주가가 최고치를 기록하고 외환시장이 상대적으로 안정적일 리 없다고 그는 지적한다.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떨까?
2022년의 부진 이후 위험자산은 낙관론과 P/E 상승에 힘입어 급등했다. 막스는 종말론적 전망을 하지는 않지만 신중한 입장이다. 다른 이들의 신중함이 줄어들 때 우리는 더욱 신중해져야 한다. 큰 폭의 하락을 감당할 수 없다면 일부 이익 실현을 고려해볼 만하다.
50년의 투자 경력에도 그의 조언은 놀랍도록 단순하다.
"투자하라. 많이 투자하라. 일찍 투자하라. 꾸준히 하라." 민첩해지려 하지 말라. 시장 타이밍 잡기는 "세상에서 가장 어려운 일"이라고 그는 말한다.
"리스크에 대한 태도는 조절할 수 있지만, 시장이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라. 매우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은 당신이 특별하지 않는 한 옳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특별한 사람은 거의 없다"고 그는 결론짓는다.
50년 동안 다섯 번의 큰 예측을 한 것은 패배주의가 아닌 규율이다. 이것이 바로 35년간의 메모가 가르쳐준 가장 큰 교훈이다.